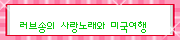[ 영월 장릉 ]
 장릉은 어린 나이에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가 삼촌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죽음을 맞은 비운의 임금인 조선 6대 왕 단종의 능으로 강원도 영월에 있다.
단종이 왕위를 잃고 상왕으로 봉해져 있던 세조 3년(1457년)에 성삼문, 박팽년 등이
상왕복위 사건으로 참형을 당한 날 단종은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봉되고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당하게 된다. 청령포에서 2개월 남짓 기거했으나 홍수로 인하여
물이 범람해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긴다.
같은 해 여섯째 삼촌인 금성대군의 단종복위 계책이 발각되어 노산군에서 다시
폐서인으로 강봉되고, 계속되는 복위운동을 우려한 세조는 10월 24일 금부도사
왕방연에게 사약을 내려보내 단종을 죽인다. 왕방연은 사약을 차마 드리지 못하고
괴로워했다고 한다. 그때 단종의 나이 17세였다.
세조는 비정하게도 단종의 시신마저 동강에 버리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명을 내린다. 단종의 유해가 동강에 흘렀는데 영월에서
행정 업무를 보좌하던 영월호장 엄흥도가 아들 삼형제와 함께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달게 받겠다"는 충정으로 옥체를 수습하여 자신의 선산인 동을지산
지금의 장릉에 모셨다.
이후 중종 11년(1516년) 노산묘를 찾으라는 왕명이 있었고 중종 36년(1541년)
노산묘를 찾아 수축봉제 하였다. 다시 숙종 24년(1698년)에 추복하여 묘호를
단종으로 하고 능호를 장릉이라 하였다. 단종이 승하하신지 241년만의 일이다.
단종의 복위와 얽혀 목숨을 잃은 이만 해도 200여 명, 그래서인지 장릉은
여느 왕릉과 달리 단종에게 죽음으로 충절을 다한 신하들을 위해 장릉 밑에
충신단이 설치되어 있다.
장릉은 어린 나이에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가 삼촌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죽음을 맞은 비운의 임금인 조선 6대 왕 단종의 능으로 강원도 영월에 있다.
단종이 왕위를 잃고 상왕으로 봉해져 있던 세조 3년(1457년)에 성삼문, 박팽년 등이
상왕복위 사건으로 참형을 당한 날 단종은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봉되고 영월
청령포로 유배를 당하게 된다. 청령포에서 2개월 남짓 기거했으나 홍수로 인하여
물이 범람해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긴다.
같은 해 여섯째 삼촌인 금성대군의 단종복위 계책이 발각되어 노산군에서 다시
폐서인으로 강봉되고, 계속되는 복위운동을 우려한 세조는 10월 24일 금부도사
왕방연에게 사약을 내려보내 단종을 죽인다. 왕방연은 사약을 차마 드리지 못하고
괴로워했다고 한다. 그때 단종의 나이 17세였다.
세조는 비정하게도 단종의 시신마저 동강에 버리고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명을 내린다. 단종의 유해가 동강에 흘렀는데 영월에서
행정 업무를 보좌하던 영월호장 엄흥도가 아들 삼형제와 함께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달게 받겠다"는 충정으로 옥체를 수습하여 자신의 선산인 동을지산
지금의 장릉에 모셨다.
이후 중종 11년(1516년) 노산묘를 찾으라는 왕명이 있었고 중종 36년(1541년)
노산묘를 찾아 수축봉제 하였다. 다시 숙종 24년(1698년)에 추복하여 묘호를
단종으로 하고 능호를 장릉이라 하였다. 단종이 승하하신지 241년만의 일이다.
단종의 복위와 얽혀 목숨을 잃은 이만 해도 200여 명, 그래서인지 장릉은
여느 왕릉과 달리 단종에게 죽음으로 충절을 다한 신하들을 위해 장릉 밑에
충신단이 설치되어 있다.
 17세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던 조선시대 제 6대 임금이었던 단종은 그 살아온
인생만큼 비운의 연속이었다. 1441.7.23일생으로 이름은 홍위이고 문종의 아들로
어머니는 현덕왕후 권씨이다. 妃는 돈령부판사 송현수의 딸인 정순왕후였으며,
1448년(세종30년) 에 왕세손에 책봉되고, 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 세자에 책봉되었다.
병약한 문종은 세자의 안위가 우려되어 김종서, 황보인 및 집현전 학자인 성삼문,
박팽년,신숙주등에게 후세를 부탁하였고,12세때 왕위를 등극하고 14세에 결혼하였다.
하지만 당시 숙부였던 수양대군에 의해 1453년 김종서,황보인이 제거되면서 모든
권력의 힘은 수양대군에게 넘어갔다. 1455년에 단종의 중신들을 제거하는데 공을
세운 한명회등의 강요로 당시 나이 15세때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넘겨주고 형식적인
왕인 "상왕"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단종 나이 17세인 1457.6.22 청령포로 유배되었고 그 이후 수양대군의 동생이며
노산군의 숙부인 금성대군이 경상도의 순흥에서 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되어 사사되자
노산군은 또다시 서인으로 강등이 되었고 세조의 신하들의 끈질긴 요청으로 단종이
청령포로 유배된지 약 4개월 후인 1457.10.24. 세조에 의해 사약을 받고 관풍헌에서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
후세에 들어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 1456년 죽음을 당한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
유응부, 유성원등을 사육신,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을 분개하여 한 평생을 죄인으로
자처한 김시습등 6명을 생육신으로 부른다. 단종의 억울한 죽음과 강봉은 그뒤
약200여년 뒤인 1681년 숙종 7년에 신원되어 대군에 추봉되었고, 1698년 숙종
24년에 다시 임금으로 복위되어 묘호(廟號)를 단종이라 하였다.
또한 그의 왕비였던 정순왕후는 단종과 마찬가지로 평생을 비운 속에 살다간
왕비였다. 14세에 결혼하여 불과 3년 정도 단종과 함께 살았을 뿐이고
그 이후는 평생을 한에 맺혀 일생을 살다간 왕비였다.
17세의 짧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던 조선시대 제 6대 임금이었던 단종은 그 살아온
인생만큼 비운의 연속이었다. 1441.7.23일생으로 이름은 홍위이고 문종의 아들로
어머니는 현덕왕후 권씨이다. 妃는 돈령부판사 송현수의 딸인 정순왕후였으며,
1448년(세종30년) 에 왕세손에 책봉되고, 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 세자에 책봉되었다.
병약한 문종은 세자의 안위가 우려되어 김종서, 황보인 및 집현전 학자인 성삼문,
박팽년,신숙주등에게 후세를 부탁하였고,12세때 왕위를 등극하고 14세에 결혼하였다.
하지만 당시 숙부였던 수양대군에 의해 1453년 김종서,황보인이 제거되면서 모든
권력의 힘은 수양대군에게 넘어갔다. 1455년에 단종의 중신들을 제거하는데 공을
세운 한명회등의 강요로 당시 나이 15세때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넘겨주고 형식적인
왕인 "상왕"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단종 나이 17세인 1457.6.22 청령포로 유배되었고 그 이후 수양대군의 동생이며
노산군의 숙부인 금성대군이 경상도의 순흥에서 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되어 사사되자
노산군은 또다시 서인으로 강등이 되었고 세조의 신하들의 끈질긴 요청으로 단종이
청령포로 유배된지 약 4개월 후인 1457.10.24. 세조에 의해 사약을 받고 관풍헌에서
일생을 마감하게 된다.
후세에 들어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 1456년 죽음을 당한 성삼문,박팽년,하위지,이개,
유응부, 유성원등을 사육신,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을 분개하여 한 평생을 죄인으로
자처한 김시습등 6명을 생육신으로 부른다. 단종의 억울한 죽음과 강봉은 그뒤
약200여년 뒤인 1681년 숙종 7년에 신원되어 대군에 추봉되었고, 1698년 숙종
24년에 다시 임금으로 복위되어 묘호(廟號)를 단종이라 하였다.
또한 그의 왕비였던 정순왕후는 단종과 마찬가지로 평생을 비운 속에 살다간
왕비였다. 14세에 결혼하여 불과 3년 정도 단종과 함께 살았을 뿐이고
그 이후는 평생을 한에 맺혀 일생을 살다간 왕비였다.
 단종이 묻힌 봉분, 즉 능상에 올라보면 사방이 탁트인 것이 한눈에 보기에도
명당임을 직감하게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해가 잘 드는 곳이니
어찌 명당이 아니겠는가.
능상을 두른 벽돌 곡장, 그 안쪽으로 양석과 호석 각각 한쌍, 능상 앞의 혼유석,
그리고 장면등 1기, 또 양쪽의 망주석 그리고 문인석 1쌍, 마석 1쌍이 석물의
전부다. 다른 왕릉에 비해 조촐하면서도 단출한 모습이다.
그런데 장릉의 소나무는 단종의 한을 알기나 하듯이 사방의 소나무들이
단종의 능을 향해 읍하고 있는 자세처럼 틀어져 있는 것이다.
단종이 묻힌 봉분, 즉 능상에 올라보면 사방이 탁트인 것이 한눈에 보기에도
명당임을 직감하게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해가 잘 드는 곳이니
어찌 명당이 아니겠는가.
능상을 두른 벽돌 곡장, 그 안쪽으로 양석과 호석 각각 한쌍, 능상 앞의 혼유석,
그리고 장면등 1기, 또 양쪽의 망주석 그리고 문인석 1쌍, 마석 1쌍이 석물의
전부다. 다른 왕릉에 비해 조촐하면서도 단출한 모습이다.
그런데 장릉의 소나무는 단종의 한을 알기나 하듯이 사방의 소나무들이
단종의 능을 향해 읍하고 있는 자세처럼 틀어져 있는 것이다.
 능상 앞에 아주 가녀린 소나무 한그루가 서 있다.
1999년 남양주 문화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하는데, 남양주라면
정순왕후 송씨의 사릉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름도 정령수라고
지어 나무라에라도 영혼을 실어 오가게 하려는 배려였다고 한다.
550여년 전의 비극이지만 이제라도 그 서러움을 조금은 삭히시라는
뜻일 게다.
단종의 왕비였던 정순왕후도 평생을 비운 속에 살다 갔다.
14세에 결혼하여 불과 3년 정도 단종과 함께 살았지만 단종의 영월
유배 이후, 영영 상봉을 못하고 통한의 일생을 끝마친 것이다.
정순왕후는 강봉된 후에 돌보는 이가 없어 구걸을 하여 연명했으며
82세로 장수하였다고 한다. 한이 너무 많이 쉽게 죽을 수 없었던 것일까.
능상 앞에 아주 가녀린 소나무 한그루가 서 있다.
1999년 남양주 문화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하는데, 남양주라면
정순왕후 송씨의 사릉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름도 정령수라고
지어 나무라에라도 영혼을 실어 오가게 하려는 배려였다고 한다.
550여년 전의 비극이지만 이제라도 그 서러움을 조금은 삭히시라는
뜻일 게다.
단종의 왕비였던 정순왕후도 평생을 비운 속에 살다 갔다.
14세에 결혼하여 불과 3년 정도 단종과 함께 살았지만 단종의 영월
유배 이후, 영영 상봉을 못하고 통한의 일생을 끝마친 것이다.
정순왕후는 강봉된 후에 돌보는 이가 없어 구걸을 하여 연명했으며
82세로 장수하였다고 한다. 한이 너무 많이 쉽게 죽을 수 없었던 것일까.
 [정려각]
정려각은 1726년(영조 2년)에 어명으로 세운 비각으로 엄흥도의 충절을 기리는
정려문이다.
이 비석은 1833년(순조 33년)에 가필하여 같은 해에 또 다시 증축하였으며,
1876년 (고종 13년)에 고종이 증시하기를 '충의'라 하여
1879년 (고종 16년) 비석에 있는 것을 다시 고쳤다.
[정려각]
정려각은 1726년(영조 2년)에 어명으로 세운 비각으로 엄흥도의 충절을 기리는
정려문이다.
이 비석은 1833년(순조 33년)에 가필하여 같은 해에 또 다시 증축하였으며,
1876년 (고종 13년)에 고종이 증시하기를 '충의'라 하여
1879년 (고종 16년) 비석에 있는 것을 다시 고쳤다.
 엄흥도는 동강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 영월의 동을지산에 올라
노루가 앉아있던 자리를 장지로 택했다. 이때가 음력 10월 24일, 양력으로
11월 말경이니까 그무렵 영월의 날씨로는 이미 땅이 얼었을 것이다.
노루덕에 얼지 않은 땅을 쉽사리 팔 수 있었고, 양지바른 땅을 구할 수 있었다.
엄흥도는 동강에 버려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 영월의 동을지산에 올라
노루가 앉아있던 자리를 장지로 택했다. 이때가 음력 10월 24일, 양력으로
11월 말경이니까 그무렵 영월의 날씨로는 이미 땅이 얼었을 것이다.
노루덕에 얼지 않은 땅을 쉽사리 팔 수 있었고, 양지바른 땅을 구할 수 있었다.
 [낙촌비각]
박충원 정려각...
영월 장릉 경내 입구에 낙촌기적비각이 있으니 영월군수이던 낙촌 박충원이
노산묘를 찾은 일에 대한 사연을 기록한 기적비각이다.
이 비각은 박충원의 충성됨을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1972년에 세운 것이다.
충신 박충원은 중종 26년(1531년) 문과에 급제하여 문경공이란 시호를 받았다.
영월군수로 부임하여 있을 때 노산국으로 강봉되어 있던 단종이 꿈에 현몽하여
묘를 찾아달라고 하므로 충신 엄흥도의 후손과 함께 중종 36년(1541년)에
암장되었던 묘를 찾아 수축하고 제사를 지냈다.
[낙촌비각]
박충원 정려각...
영월 장릉 경내 입구에 낙촌기적비각이 있으니 영월군수이던 낙촌 박충원이
노산묘를 찾은 일에 대한 사연을 기록한 기적비각이다.
이 비각은 박충원의 충성됨을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1972년에 세운 것이다.
충신 박충원은 중종 26년(1531년) 문과에 급제하여 문경공이란 시호를 받았다.
영월군수로 부임하여 있을 때 노산국으로 강봉되어 있던 단종이 꿈에 현몽하여
묘를 찾아달라고 하므로 충신 엄흥도의 후손과 함께 중종 36년(1541년)에
암장되었던 묘를 찾아 수축하고 제사를 지냈다.
 엄흥도가 죽으면서 단종의 묘소를 후손에게 발설하지 못하게 했고,
몰래 집안에서만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중종 때에 이르기까지 영월군수가 부임 초에 차례로 변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무도 영월군수로 가기를 원치 않던 차에
밀양사람 박충원이 영월군수로 자원해서 갔다.
그의 꿈에 노산군이 나타남으로써 그 묘소를 찾을 수 있었고 박충원이 조정에
건의하여 노산군묘로서 조촐한 묘역을 갖추고 정중하게 제사를 올리니
그 후부터는 군수가 부임초에 죽어가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엄흥도가 죽으면서 단종의 묘소를 후손에게 발설하지 못하게 했고,
몰래 집안에서만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중종 때에 이르기까지 영월군수가 부임 초에 차례로 변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무도 영월군수로 가기를 원치 않던 차에
밀양사람 박충원이 영월군수로 자원해서 갔다.
그의 꿈에 노산군이 나타남으로써 그 묘소를 찾을 수 있었고 박충원이 조정에
건의하여 노산군묘로서 조촐한 묘역을 갖추고 정중하게 제사를 올리니
그 후부터는 군수가 부임초에 죽어가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재실]
이 건물의 처음 건립연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32년 중건하였다.
이곳에는 능을 지키는 참봉1인과 수호군 9인이 기거하였으며
매년 단종제향을 지낼 때 이곳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기를 비롯한 각종 사용기구를 보관해오던 곳이다.
[재실]
이 건물의 처음 건립연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1932년 중건하였다.
이곳에는 능을 지키는 참봉1인과 수호군 9인이 기거하였으며
매년 단종제향을 지낼 때 이곳에서 제물을 준비하고
제기를 비롯한 각종 사용기구를 보관해오던 곳이다.
 [배식단]
이곳은 단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충신위, 조사위, 환자군노,
여인위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한식때 제사를 올리는 제단으로
제례를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
배식단의 가장 높은 자리는 각각 왕실, 종친, 그리고 이름도 낯익은
사육신을 비롯한 충신들을 위한 충신위이다. 그리고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벼슬없는 한미한 이들을 위한 조사위가 있으며
단종을 곁에서 모시다가 삶과 죽음을 함께한 환관위가 있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 궁녀와 궁비, 그리고 무녀를 모신 여인위도
따로 모셔졌다는 것이다. 궁녀와 궁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무녀 용안.불덕.내은덕.덕비는 왜 여기에 들어있을까?
이들은 단종이 복위되어 한양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쳤다는
죄목으로 죽게 되었다. 이른바 유언비어 살포죄였던 것이다.
[배식단]
이곳은 단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충신위, 조사위, 환자군노,
여인위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한식때 제사를 올리는 제단으로
제례를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
배식단의 가장 높은 자리는 각각 왕실, 종친, 그리고 이름도 낯익은
사육신을 비롯한 충신들을 위한 충신위이다. 그리고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벼슬없는 한미한 이들을 위한 조사위가 있으며
단종을 곁에서 모시다가 삶과 죽음을 함께한 환관위가 있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 궁녀와 궁비, 그리고 무녀를 모신 여인위도
따로 모셔졌다는 것이다. 궁녀와 궁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무녀 용안.불덕.내은덕.덕비는 왜 여기에 들어있을까?
이들은 단종이 복위되어 한양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쳤다는
죄목으로 죽게 되었다. 이른바 유언비어 살포죄였던 것이다.
 [배식단사]
배식단 맞은편에 있는 배식단사에는 이들의 위폐가 모셔져 있어서
배식단과 짝을 이룬다.
정조 15년(1791)에 건립된 곳으로 매년 한식날 단종제향후 제사를 지내는데
배식단과 배식단사는 다른 왕릉에서는 볼 수 없는 역사적 유물이다.
[배식단사]
배식단 맞은편에 있는 배식단사에는 이들의 위폐가 모셔져 있어서
배식단과 짝을 이룬다.
정조 15년(1791)에 건립된 곳으로 매년 한식날 단종제향후 제사를 지내는데
배식단과 배식단사는 다른 왕릉에서는 볼 수 없는 역사적 유물이다.
 배식단사는 단종을 위하여 목숨을 받친 충신위(忠臣位) 32인,
조사위(朝士位) 198인, 환관군노위(宦官軍奴位) 28인,
여인위(女人位) 6인을 합하여 264인의 위패(位牌)를 모셔놓은 곳이다.
배식단사는 단종을 위하여 목숨을 받친 충신위(忠臣位) 32인,
조사위(朝士位) 198인, 환관군노위(宦官軍奴位) 28인,
여인위(女人位) 6인을 합하여 264인의 위패(位牌)를 모셔놓은 곳이다.
 [정자각과 수복성]
1698(숙종24년)노산묘를 장릉으로 추봉하고
영조 9년에 비각과 수복실, 정자각을 세웠다.
[정자각과 수복성]
1698(숙종24년)노산묘를 장릉으로 추봉하고
영조 9년에 비각과 수복실, 정자각을 세웠다.
 한식날인 단종제향때 제물을 올리는 곳으로 정자각 또는 배위청(拜位廳)이라 한다.
이 건물의 능과 경내를 관리하는 능지기가 기거하는 곳으로 영조 9년(1733년)에
정자각과 함께 세운 것이다.
한식날인 단종제향때 제물을 올리는 곳으로 정자각 또는 배위청(拜位廳)이라 한다.
이 건물의 능과 경내를 관리하는 능지기가 기거하는 곳으로 영조 9년(1733년)에
정자각과 함께 세운 것이다.
 [영천]
영천은 장릉의 제사를 지내는 우물로서 정조 15년(1791년)에 군수 박기정이
조정에 보고하여 장릉 제정(祭井) 으로 칭하게 되었다.
보통 때에는 조금씩 샘이 솟았으나 매년 한식 때, 제향을 지낼 때에는
물이 많이 용출하였다.
[영천]
영천은 장릉의 제사를 지내는 우물로서 정조 15년(1791년)에 군수 박기정이
조정에 보고하여 장릉 제정(祭井) 으로 칭하게 되었다.
보통 때에는 조금씩 샘이 솟았으나 매년 한식 때, 제향을 지낼 때에는
물이 많이 용출하였다.
 우물의 구조는 사방이 돌담으로 둘러있고, 우물 깊이는 1.5m 정도이고
화강석으로 정방형 모양으로 쌓아 올려져 있다.
우물의 구조는 사방이 돌담으로 둘러있고, 우물 깊이는 1.5m 정도이고
화강석으로 정방형 모양으로 쌓아 올려져 있다.
 [단종역사관]
단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단종역사관
잊혀지고 왜곡된 단종의 역사를 바로 잡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건립된
단종 역사관은 단종의 즉위식에서부터 사약을 받는 모습 등 단종의 일대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연대기식으로 모형 전시되어 있다.
[언덕에서 내려다본 충신단 전경]
[단종역사관]
단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단종역사관
잊혀지고 왜곡된 단종의 역사를 바로 잡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건립된
단종 역사관은 단종의 즉위식에서부터 사약을 받는 모습 등 단종의 일대기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연대기식으로 모형 전시되어 있다.
[언덕에서 내려다본 충신단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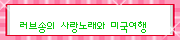
|




 [정려각]
[정려각]
 [낙촌비각]
[낙촌비각]
 [재실]
[재실] [배식단]
[배식단] [배식단사]
[배식단사]
 [정자각과 수복성]
[정자각과 수복성]
 [영천]
[영천]
 [단종역사관]
[단종역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