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찾아 떠나는 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잠시 길을 멈춰 지나온 삶을 투영해보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잠시 길을 멈춰 지나온 삶을 투영해보라.
 은해사에서 나와 신령면 쪽으로 8km 정도 가다보면 거조암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효성왕 2년(738) 원참도사가 이 절을 창건했다고 전하고, 경덕왕 때 왕명으로
창건했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은해사에서 나와 신령면 쪽으로 8km 정도 가다보면 거조암을 만날 수 있습니다.
효성왕 2년(738) 원참도사가 이 절을 창건했다고 전하고, 경덕왕 때 왕명으로
창건했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은 고려시대 이전의 것은 현재 전하지 않으며
지금 남아 있는 고려시대의 목조 건축물로는 13세기 초에 건립된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1308),
부석사 조사당(1377), 이곳 거조암 영산전(1375)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물은 고려시대 이전의 것은 현재 전하지 않으며
지금 남아 있는 고려시대의 목조 건축물로는 13세기 초에 건립된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1308),
부석사 조사당(1377), 이곳 거조암 영산전(1375) 등이 있습니다.
 국보 14호로 지정된 영산전은 소박하면서 간결한 멋을 지니고 있는데
장대석과 잡석으로 축조한 기단 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영산전 내부는 중앙에 불단을 배치하고 오백나한상을 안치해놓았습니다.
국보 14호로 지정된 영산전은 소박하면서 간결한 멋을 지니고 있는데
장대석과 잡석으로 축조한 기단 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영산전 내부는 중앙에 불단을 배치하고 오백나한상을 안치해놓았습니다.
 영산전이란 석가여래가 영축산(영취산)에서 묘법연화경을 설법하고 계신
모습을 그린 영산회상도를 봉안해 놓은 전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설법을 듣던 500나한을 부처님과 함께 모셔놓았습니다.
영산전 안에는 526분의 나한상이 극락도(極樂圖)에 의하여 배열이 되어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법화스님께서 신통력을 발휘하여 나한상을 모실 때에
각 불상들이 스스로 제자리를 잡아 앉았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영산전이란 석가여래가 영축산(영취산)에서 묘법연화경을 설법하고 계신
모습을 그린 영산회상도를 봉안해 놓은 전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설법을 듣던 500나한을 부처님과 함께 모셔놓았습니다.
영산전 안에는 526분의 나한상이 극락도(極樂圖)에 의하여 배열이 되어 있는데
전설에 따르면 법화스님께서 신통력을 발휘하여 나한상을 모실 때에
각 불상들이 스스로 제자리를 잡아 앉았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나한(羅漢)이란 아라한(阿羅漢)의 준말로서 최상급의 수행자로 공덕을 구비한 자를
총칭하여 이릅니다.
나한은 석가여래가 열반에 드신 후 미륵불이 나타날 때까지 이 세상의 불법을
수호하도록 수기받은 분들을 가리키며 응공(應供:온갖 번뇌를 끊어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으로부터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처1’를 달리 이르는 말)
또는 응진(應眞:아라한)으로 번역됩니다.
나한(羅漢)이란 아라한(阿羅漢)의 준말로서 최상급의 수행자로 공덕을 구비한 자를
총칭하여 이릅니다.
나한은 석가여래가 열반에 드신 후 미륵불이 나타날 때까지 이 세상의 불법을
수호하도록 수기받은 분들을 가리키며 응공(應供:온갖 번뇌를 끊어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으로부터 공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처1’를 달리 이르는 말)
또는 응진(應眞:아라한)으로 번역됩니다.
  불교가 극도로 융성했던 고려시대에는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의 자연스런 표출로
나한에 대한 신앙이 상당히 커져 있었으며, 이 나한상의 조각형태는 일정한 규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승들의 개성적인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500나한의 자세와 표정이 제각각이며 익살스런 멋까지 풍기고 있어
한분 한분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규격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낸 나한상들은 그림에 비한다면 마치 캐리커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국의 멋을 지니고 있다 해서 일찍이 유럽여행도 다녀오셨습니다.
불교가 극도로 융성했던 고려시대에는 스님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의 자연스런 표출로
나한에 대한 신앙이 상당히 커져 있었으며, 이 나한상의 조각형태는 일정한 규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승들의 개성적인 모습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500나한의 자세와 표정이 제각각이며 익살스런 멋까지 풍기고 있어
한분 한분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규격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낸 나한상들은 그림에 비한다면 마치 캐리커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국의 멋을 지니고 있다 해서 일찍이 유럽여행도 다녀오셨습니다.
 영산전 앞에 있는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산전 앞에 있는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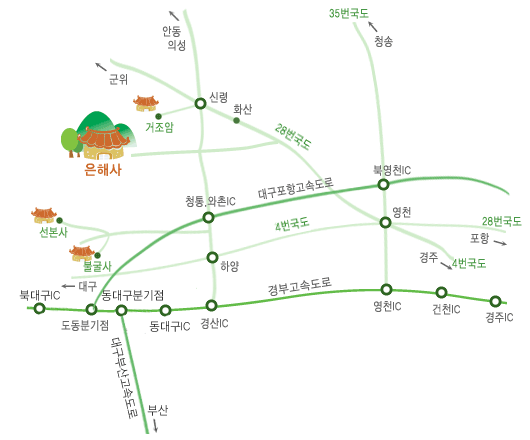


|